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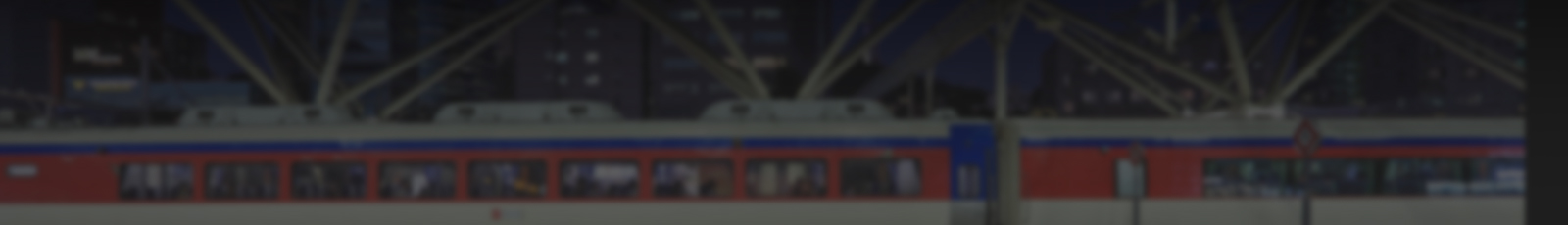
-
 해상운송의 역할과 위상
해상운송의 역할과 위상
러시아에서 해상운송은 대외교역의 발전, 그리고 연방주체들의 경제발전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 달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터 대제 이래 러시아 개혁사의 전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 수호가 항상 강조되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가 자유롭게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만과 선대를 보유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서 강력한 선대를 구축하는 것과 지정학적 이익을 수호하는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러시아와 같이 풍부한 자원, 광활한 영토, 그리고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강력한 해운력(shipping power)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외경제관계 및 정치군사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에는 3개의 대양(대서양, 북극해, 태평양)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바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 경계선은 37,655km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해상운송은 다른 해양강국들과 견줄 수 있는 좋은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해상운송 조건은 소연방 시기와 비교한다면 새롭게 형성된 지정학적 환경에 의해 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구 소연방 시기 자유롭게 이용했던 흑해, 아조프해, 발트해, 카스피해 대부분의 항구들이 새롭게 독립한 구 소연방 공화국들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다. 구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1992년 1월 해운부는 소멸되었고, 러시아는 구 소연방 해운부에 속해 있던 17개의 대형선사 중 10개, 그리고 17개의 주요 항구 중 8개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1970~80년대가 해상운송의 ‘황금기’라고 한다면 구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시작된 1990년대는 해상운송의 대혼란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옐친 대통령 시기 시장개혁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외교역에 대한 국가독점이 폐기되고 해운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원칙이 무분별하게 포기됨에 따라 러시아는 과거 해운강국의 지위를 급속도로 잃어버렸다. 구 소연방 공화국 간 해상운송 부문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는 해체되었고, 경제침체에 따른 물동량의 감소로 해운선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으며, 정부의 투자부족으로 항만 인프라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급기야 1993년 10월 러시아는 2000년까지 총 589척에 840만 DWT의 선박 건조를 목표로 '러시아 상선 부활 프로그램'을 입안했고, 항만 및 인입 철도의 발전, 해상운송 생산인프라의 발전 계획을 내걸었다. 그러나 위의 기간 동안 건조된 선박은 149척(347만 DWT)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 중 42척(34만 9,000 DWT)만이 국적선으로 등록되고 나머지 107척(318만 5,000 DWT)은 외국적선으로 등록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해상운송 발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장기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러시아의 해운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교역의 지속적인 성장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러시아의 해상운송은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 특히 화물의 수출입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러시아 선박을 외국용선회사에 기간용선계약으로 임대하는 경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해상운송의 위상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해상화물운송은 톤·km 기준으로 철도와 파이프라인 운송 다음의 제3위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내륙수운에 자리를 내주어 제4위로 물러났고, 2004년에는 내륙수운과 해상운송의 운송실적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둘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해상운송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본원적으로 해상운송은 자연조건에 의존적인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동절기 해안 결빙으로 인해 연중 이용가능한 부동항이 매우 적은 상태에 있다. 또한 해상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만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투자부족으로 러시아의 항만시설은 매우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항만들이 주요 경제중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의 대외교역이 주로 유럽국가들에 집중되어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경제·교역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도 해상운송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수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해상운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원유 및 원자재 수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로 수출입 물동량이 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도 물류비용 절감, 개혁개방 가속화, 글로벌 운송망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항만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운·항만 부문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인프라 현황
해운인프라 현황
<표 1> 해운상선 선박 현황(연말 기준)

자료 : Росстат,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тран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2004: Стат. сб., Росстат, 2004, p. 73.
최근 러시아의 해운 분야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 것 중의 하나는 세계 운송서비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러시아 선사들이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곧바로 러시아 국적 선박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러시아에 의해 통제되는 총 선박량이 감소했지만 러시아 국적선의 선박량은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국적 해양상선은 1992년 1,060만 DWT에서 2003년 260만 DWT로 4.1배나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선박 발주가 늘고 2002~2003년간 유조선을 중심으로 총 29척에 208만8,140 DWT의 선박이 새로 인도되어 이러한 현상은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선박은 연초 기준으로 2000년 1,120만 DWT에서 2004년 1,280만 DWT로 14%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 국적선박은 450만 DWT에서 540만 DWT로 19%가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에 의해 통제되는 총 선박량에서 러시아 국적선의 비중은 42%에 불과하고 58% 이상이 외국적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다.<표 2> 러시아 선박의 선적별 구조(연초 기준)

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ояние и пробле-мы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темы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Состояние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Морской транспорт," http://www.mintrans.ru/pressa/TransStrat_Sostoyanie_3.htm(검색일: 2003. 12. 30);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2002~2010)". Подпрограмма "Морской транспорт". Редакция 2.0, Москва, 2005.문제의 심각성은 해상운송에 의한 러시아 대외교역 물동량의 증가가 선박량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운송에 의한 러시아의 대외교역 물동량은 1998년 2억 400만 톤에서 2004년 4억 5,000만 톤으로 증가되었고, 러시아의 대외교역 운송을 위해 지불한 용선료는 1998년 40억 달러에서 2004년 75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2004년 러시아 선사가 받은 대선료가 3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 대외교역 운송을 위한 용선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외교역을 위해 화주가 불가피하게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상황은 운송비를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 이렇게 여전히 외국적 선박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러시아의 국내 법령이 불합리하여 선주가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외국적선으로 등록하려는 경향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는 ‘러시아국제선적등록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러시아는 선적등록세 수입보다는 용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대외교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법령이 실행되면 수출입거래 등과 관련된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선박항행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며, 선박과 관련된 높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등 러시아 경제에 커다란 승수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선대는 매우 노후화된 선박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량의 선박들이 폐선(廢船)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선박의 선령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년 이상의 선박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선박의 평균선령은 20년을 초과하는 반면에 외국적 선박의 평균선령은 9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노후화된 러시아 국적선박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신조로 대체하는 등 선박의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표 3> 러시아 공용선박의 선령구조 (단위 : 연말 기준, %)

자료 : Росстат,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тран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2004: Стат. сб., Росстат, 2004, p. 74. 항만 현황
항만 현황
2003년 말 현재 러시아에는 총 43개의 상업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하역시설은 351개, 부두의 안벽길이는 5만 7,300m에 달한다. 주요 항만으로는 북서지역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남부지역에 노보라시스크, 투압세, 극동지역에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나호트카 등의 항만을 갖고 있다.
최근 러시아 항만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8~2002년간 러시아 항만 전체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2.1배나 증가하였다. 2003년 러시아 항만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2억 8,570만 톤으로 2002년 대비 9.6%가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화물은 1억 3,2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액화물은 1억5,3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했다. 2004년 상반기 물동량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총 1억 6,000만 톤으로 2003년 동기대비 20.4%가 성장했다. 이중 건화물은 7,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6.8%, 액화물은 8,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3.9%가 성장했다.
<표 4> 러시아 상업항의 시설 및 화물처리 현황(연말 기준)

자료 : Росстат,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тран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2004: Стат. сб., Росстат, 2004, p. 78.이러한 사실을 통해 러시아의 원유수출의 급증에 따른 액화물 처리 증가가 최근 러시아 항만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러시아 상업항의 화물처리실적은 <표 4>에서와 같이 1억 460만톤을 기록하여 1995년과 비교하여 69.2%가 증가했다.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2003년 수출물동량은 전체의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물동량의 처리실적은 1995년 실적의 거의 두 배로 증가되었다.
수입물동량과 연안운송 물동량은 각각 12.1%와 9.8%를 기록하고 있다. 연안운송 물동량 처리실적은 1995년과 비교하여 사실상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반면 수입물동량 처리실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화물 종류별로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화물과 벌크화물이 각각 47.8%,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이루고 있고, 벌크화물 중에서는 석탄 및 코크스, 일반화물 중에서는 금속류가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항만의 급속한 성장세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러시아정부의 항만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와 결코 무관치 않다. 1992~2002년간 러시아 항만에는 총 연간 2억 7,000만 톤의 처리능력의 시설이 개발되었고,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2003년 두 해만 하더라도 안벽길이는 1,995m나 확장되었으며, 연간 3,117만 톤에 달하는 물동량 처리능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프리모르스크항의 원유 처리시설, 우스찌-루가항의 벌크화물 처리시설,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처리시설, 보스토치니항의 광물비료처리 및 석유저장 시설, 노보라시스크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시설 등이 확장되거나 새로이 건설되었고, 카스피해의 마하츠칼라항, 올랴 신항만이 개발되고 있다.<표 5> 러시아 항만 신규시설 건설 및 확장(2002~2003년)

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2002~2010)". П-одпрограмма "Морской транспорт". Редакция 2.0, Москва, 2005. Таблица 2.2.
러시아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는 일단 러시아의 비약적인 교역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항만 발전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항만 발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파이프라인의 원유운송 능력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운송모드로서 항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이후 발트해, 흑해에 위치한 주요 항만을 상실함에 따라 대체 항만 개발이 시급해졌다. 셋째, 제3국과의 연계성이 용이하고 투자유치에 유리한 항만 및 배후지역을 개발하여 제조업, IT산업, 중화학공업 등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도 항만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자국의 내륙교통망과 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통망과 연결하고 자국을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대형 항만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러시아정부는 2010년에 이르면 러시아 항만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2002년의 약 2배에 달하는 5억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상운송의 발전 전망
해상운송의 발전 전망
러시아는 해상운송의 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선대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교통체계 현대화(2002~2010년)' 연방특별프로그램의 ‘해상운송’ 하위프로그램에 따르면 2002~2010년간 러시아는 건화물선 124만 6,800 DWT, 액화물선 624만 DWT 등 총 748만 6,800 DWT의 선박을 새로이 확충할 계획이다.1. 선박 현황
러시아의 해운상선(maritime merchant fleet) 보유량은 2003년 말 기준으로 3,898척에 총 824만 5,300 DWT이다. 유형별로 살펴본 선박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체 선박에서 어선, 연구·조사선, 공급선, 예선 등의 비중은 척수 기준으로는 52.3%, 선박량 기준으로는 13.7%를 차지하여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선대구성은 주요 해운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선 중심의 해운구조를 갖고 있다.
선박량 기준으로 2003년도의 선대를 살펴보면 일반화물선이 약 307만 DWT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유조선의 경우에는 22.0%, 광석전용선 및 벌크화물선의 경우에는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의 선박량 규모는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2003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4만 3,400 DWT가 증가되었고, 특히 유조선과 일반화물선의 선박량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에 벌크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6> 연도별 선박 건조 계획(단위 : 천 DWT)

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2002~2010)". П-одпрограмма "Морской транспорт". Редакция 2.0, Москва, 2005.최근 러시아의 해상운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석유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유조선 중심의 선박 발주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표 7>에서와 같이 2005년 6월 기준으로 러시아의 선박발주량은 516만 9,000 DWT로 전 세계 10위에 위치해 있다. 이 중 약 96%에 해당되는 496만 1,000 DWT가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 및 석유제품운반선 포함)으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1.3%와 2.7%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러시아에서 유조선 위주의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할린 I, II, III 등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이미 일부에서 상업생산이 시작되었고, 티만, 페초라, 카스피해, 북극해, 동시베리아 등에서 유전개발 및 원유생산이 가속화되면 석유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2005년 6월 현재 러시아가 발주한 선박들이 모두 인도되는 2008년에 이르면 선박 해체량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러시아의 선박량은 현 운항선대의 34%가 증가한 2,042만 7,000 DW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교통체계 현대화(2002~2010년) 연방특별프로그램을 통해 계획 기간 중 항만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연간 3억 7,000만 톤 확충하고 연간 항만의 화물처리실적은 5억 4,200만 톤까지 증대한다는 계획 하에 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항만들 중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중심으로 한 북서지역의 항만들이다. <그림 1>,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 북서지역의 항만이 러시아의 대외교역 물동량의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2001년(30.4%)보다 4.5%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정부가 전 세계적인 컨테이너化(containerization) 현상에 주목하여 컨테이너 운송발전에 전략적인 비중을 두고 러시아 전역에 걸쳐 교통인프라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착수하면서 북서지역 항만의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표 7> 러시아의 선박발주량 순위(2005년 6월 기준)

자료 : Fairplay, Fairplay Newbuildings, 2005. 최재선 외, “러시아,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 물류 강국으로”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50호, 2005. 7, p. 12에서 재인용.
<그림 1> 2001년 러시아 항만을 통한 대외교역 물동량 처리실적
자료 : А. Ф. Котляренко, П. В. Куренков, Внешнеторговые перевозки в смешан-ном сообщении. Экономика. Логистика. Управление, СамГапс, 2002, p. 528.

<그림 2> 2003년 러시아 항만을 통한 대외교역 물동량 처리실적
자료 :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Ф, http://www.morflot.ru/html/info/activity/images/Mortrans_Ill_2003.ppt(검색일: 2005. 1. 6).
<표 8>, <그림 3>에서와 같이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발트 3국의 독립으로 리가항, 탈린항, 클라이페타항 등 발트해 연안 항구를 잃어버린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핀란드와 발트3국의 주요 항만에 의존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해왔지만 최근 러시아 항구의 운송 비중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8> 러시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자국항만과 접경국 항만 처리비중

자료 : 최재선 외, “러시아,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 물류 강국으로”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50호, 2005. 7, p. 15.

<그림 3> 항만을 통한 러시아의 대외교역물동량 처리(2003년)
자료 :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Ф, http://www.morflot.ru/html/info/activity/images/Mortrans_Ill_2003.ppt(검색일: 2005. 1. 6).상트페테르부르크항은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점항만으로서 유류, 벌크화물 및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등 항만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2002~2010년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두 배나 증가하여 6천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항구들 중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내셔널컨테이너사(HKK)’, 독일 ‘HHLA’사와 합작사인 ‘ORMI’사이다. 이 두 회사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현재 연간 60만 TEU의 처리 능력이 향후 130만 TEU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잠재 수요인 350만 TEU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북서 지역에 위치한 우스찌-루가 항만에 연간 150만 TEU 처리가 가능한 터미널이 향후 3~4년 내에 완공될 예정에 있다. 이 사업은 발트 연안과 인도양 연안의 항만을 연결하여 남부 아시아와 북부 유럽 간을 연결하는 남북 교통축을 구현하려는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우스찌-루가 항만은 이미 석탄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시설과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가 착공되었고, 항만에 대한 철도 접근 개선 공사가 루즈스카야 역 개선 공사와 함께 진행 중이다. 2010년까지 철도와 항만이 매년 3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K> 프로젝트를 통해 발트해 연안 주요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칼리닌그라드항의 항만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발전 속도 면에서 북서지역 항만들보다는 뒤지지만 아조프해·흑해·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남부지역 항만들의 시설 확장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남부지역은 러시아를 카프카즈, 중앙아시아, 지중해·흑해, 근동 및 중동 국가들과 연계하는 철도·도로·수로·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통과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이들 운송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와 유라시아통과화물 운송을 담보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이자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운송로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소연방 붕괴 이후 유라시아 지역에 새롭게 형성된 힘의 공백을 놓고 러시아와 미국 등 관련국들을 비롯해 국제 정치·경제·군사기구들이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러시아의 아조프해·흑해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흑해의 노보라시스크항을 필두로 하여 투압세항, 타간로크항, 템류크항, 카프카즈항 등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의 운송을 위한 항만시설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항만 성장이란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은 역시 카스피해 연안 항만들이다. 이 지역의 항만들은 향후 ‘남-북’ 국제운송로(South North Transport Corridor)의 구축과 유라시아통과화물의 급격한 증가라는 요인 외에도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 등의 운송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그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마하츠칼라항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 산지에서 파이프라인이나 철도운송지점까지 연계하거나 흑해의 노보라시스크항이나 투압세항까지 운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스트라한항군(群)의 일원이자 ‘남-북’ 국제운송로 교통인프라의 핵심대상인 올랴항은 총 40km 구간의 선석 보유를 목표로 현대식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를 시작했다. 2003년 9월에는 올랴항과 근교 철도간선 간의 연계 공사가 착수되었고 제1부두 완공시점에 물동량을 2백만 톤까지 증대하고 향후 항만건설이 완료되면 8백만 톤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극동지역 항만의 경우는 그 발전이 다소 느린데, 이곳에서는 광물비료 및 컨테이너 처리를 위한 시설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경제권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인식하여 극동지역 항만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제운송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항만은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항을 들 수 있다(<그림 4> 참고).
<그림 4>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의 물류 네트워크
자료 : Evgeni Novoseltsev, "Prospects of Russian Far East Marine Transport System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National Workshop on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for North-East Asia, July 21 2005, Vladivostok..
<표 9>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항만과 바니노항의 물동량 변화 및 전망(단위 : 천 톤)


자료 : FEMRI(Far-Eastern Marine Research, Design and Technology Institute) 내부자료, 2003.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군사기지로 활용된 이들 항만들은 체제전환기 국내시장의 물동량 감소를 동북아 국가들과의 수출입화물 처리로 대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계하는 물류거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물동량 처리와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항만은 보스토치니항이다. 2000년 보스토치니항의 전체 물동량은 72,605 TEU(수출 10,123 TEU, 수입 19,751 TEU, 통과 42,731 TEU)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무려 3.75배가 증가하여 272,361 TEU(수출 52,033 TEU, 수입 102,436 TEU, 통과 117,892 TEU)를 기록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은 러시아 대외교역 물동량의 약 16%, 러시아 항만을 통과하는 물동량의 약 20%를 처리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모든 해상운송의 77%는 연해주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비록 러시아 전체에서 극동지역의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3%에서 2003년 21.8%로 감소하고 있지만 처리 물동량 절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극동의 해운 전문가들은, 발트해는 심각한 환경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그리고 흑해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과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유럽지역 해상운송체계의 발전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 항만의 개발 가능성에 보다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항만과 바니노 항의 물동량 변화 및 향후 전망은 <표 9>와 같다.
향후 러시아 연해주 항만의 발전은 <그림 5>와 같이 남부에 위치한 4개의 항만군(港灣群), 즉 핫산, 블라디보스토크, 볼세카멘, 東나호트카 지역 항만군의 성장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 연해주 남부의 항만 권역
자료 : Evgeni Novoseltsev, 앞의 글.
연해주 남부의 항만 권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포시에트항, 트로이차(자루비노)항, 슬랴뱐카 만의 항구들이 핫산 항만군에 해당된다. 2003년 이들 지역 항만들은 150만 톤을 처리했지만 실제 잠재력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군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상항(商港)·어항(漁港)·유류기지와 기타 상업조직들의 선석들이 포함되는데, 2004년 이들 지역은 1,100만 톤을 처리했다. 사실상 정확한 의미에서 현재 볼쇼이카먼 항만군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에 위치한 ‘즈베즈다’ 조선소의 선석은 실제로 화물처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심 13m의 선석 건설이 가능하고 4만 5천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며 철도 인입선이 부설되어 있어 향후 그 출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東나호트카 항만군에는 나호트카 상항·어항·유류항, 보스토치니항, 말리항, 기타 상업조직들의 선석들이 포함되는데, 2003년 이들 지역은 3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향후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교통전문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교통체계의 발전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동지역 항만이 러시아의 국내운송과 장기적인 자원 수출 운송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해상운송체계를 국제운송로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연해주, 프리아무리예, 사할린 등의 항만을 통한 수출화물 운송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둘째, 앞서 언급한 첫째 모델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운송로에 편입되면서 역내 및 국제운송권역과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항만 전문가들은 결국 이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소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의 ‘통과운송’ 서비스에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통과운송 물동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연해주 항만의 통과운송 물동량은 2000년 대비 222%나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그 규모는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극동지역 항만들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는 항만시설, 항만 인입 철도역 등의 시설 부족, 그리고 화차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TSR의 운송서비스 미흡 등으로 그 발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국제운송로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극동의 연해주이다. 이 지역의 교통체계는 단지 국내운송을 담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과운송’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10> 연해주 항만의 통과운송 물동량 증가 추세(단위 : 천 톤)

자료 : Evgeni Novoseltsev, 앞의 글.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대로 연해주 남부에 위치한 4개의 항만권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TSR을 기축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물류거점을 육성한다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 남북한, 일본,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의 통합육상교통망 구축에서 ‘근거리 통과운송’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예를 들어 아키타-포시에트-훈춘 항로, 속초-자루비노-훈춘 정기항로가 활성화되어 있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한 시애틀-하얼빈 간 컨테이너 운송 등도 200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아직은 물동량이 미미하고, 중국과의 교역은 환적이 육상교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 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향후 중국 동북3성의 경제발전에 따라 거대한 물동량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동북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현재 러시아는 항만시설의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러시아의 대외교역 물동량의 운송에서 러시아 항만의 비중은 1996년 62%에서 2002년 75%로 증가되었다. 이후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서는 극동지역을 비롯한 지역의 액화물, 화학제품 및 벌크화물 처리 시설의 확충과 컨테이너화물 처리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항만인프라 발전을 위한 러시아 교통부의 정책은 대내외경제의 수요에 앞서 그것들이 선행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러시아 교통부는 2010년에 이르러 러시아항만들이 대외교역의 90%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출처 : 성원용·임동민,『러시아 교통물류정보 조사』,한국교통연구원(2005), 112~136쪽 참조.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도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